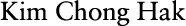1987년, 선 미술 잡지 봄호에 나는 ‘김종학의 예술과 삶’이라는 꽤 긴 글을 쓴 바 있다. 거기에서 김종학의 간단한 생애와 예술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원근법과 같은 원칙적인 약속을 무시하고 2차원적인 평면에 골몰해서 색채의 탐닉 속에 온갖 감각을 바치고 있는 화가 김종학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린 그림은 그의 그림이지만 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작품에서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시각적인 공감을 느끼고, 즉각적으로 미의 향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김종학은 마치 색채의 폭풍과도 같고 회오리바람과도 같은 감각적인 색채의 난무 속에 스스로를 불사르고 있다. 이 같은 미적 흥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불길처럼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화석화되어 영원한 형태로 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론은 화가 김종학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잃어버린 시간을 좇아 혼신의 열을 다 바치는 일만이 그의 관심사인 것이다. 그의 앞날은 누구도 예언할 수 없는 미지수로 가득 차 있다.”
그로부터 13년. 그는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미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로 박여숙 화랑에서 열리는 김종학 근작 전이다. 확실히 김종학의 작품은 예쁘지는 않다. 그러나 아름답다. 예쁘다는 것과 아름답다는 것은 거의 같은 얘기이면서도 미학적인 바탕에서 본다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예쁘다는 것은 결점이 없다는 것이요, 정리되었다는 것이며, 또 거부감이 없다는 의지만, 아름답다는 것은 때로는 개성적이고 파괴되어 있으며, 동시에 부조리도 있다. 그러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힘의 상태로서 끌고 가는 미적인 충동이다. 김종학의 작품은 확실히 아름다움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부분적인 미를 파괴하고, 조화를 파괴하여 보다 큰 하모니에 충실한다. 거기서 일어나는 미적 효과가 ‘다양의 통일’이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고은 감정의 흐름이라기보다 일종의 힘의 상태이다. 힘 자체가 아름다움을 뒤덮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종학의 근작을 보면 이전의 작품에서 보는 의식적인 조야나 미의 파괴는 없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정리된 감정의 흐름이 조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미적 태도의 변모는 호가 김종학의 인생을 바라다보는 태도와 미를 해석하는 힘에서 오는 지도 모른다. 좌우간 야생적인 김종학은 약간 길들이기 시작해서 과거 일부러 나타냈던 거친 맛이라든지 화면의 파괴를 정리하고 또 하나의 미적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 미적 경지가 ‘다양의 통일’이다. 모든 것을 하나의 상태로 통일하는 예술적인 의도는 서양 미학의 근본인 바, 오늘날의 예술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번에 김종학 근작 전의 주제가 설악산의 겨울과 봄이다. 눈 덮인 설악에서부터 꽃피기 시작하는 봄에 이르는 계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설경을 주로 하는 설악산의 겨울은 엄격하고 숭엄하다. 거기에는 자질구레한 찢어진 감정이 없고, 오직 덩어리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힘의 상태가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설경 속에서 생명의 원칙에 따라 서서히 봄을 준비하는 온갖 꽃들이 있다. 말하자면 야생화의 태동인 것이다. 화가 김종학의 제작 태도의 변화를 근작에서 바라다본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커다란 힘을 얻기 위해 일부러 파괴하거나 일부러 못 그리는 인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약간 부드럽게 대상을 바라다보고 대상을 표현한 점이다. 말하자면 감성의 척도에 있어서 숭고한 아름다움보다 우미의 세계를 추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곱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더라도 그의 창작의 기본 틀이 되어있는 야생미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을 일부러 무너뜨리고 그러한 무너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파괴 감을 그는 마음껏 즐긴다. 말하자면 야생마 같은 그의 일생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그의 나이 60대. 이제는 인생의 여로에서 쉬고도 싶고, 어느 작은 곳에 안착하고 싶은 때인데도 그는 아직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파괴를 중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와 같은 자기파괴가 지속될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화가 김종학의 매력임에는 틀림없다. 인생의 여로에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 김종학이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그의 야생을 회복시키고, 발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예술가 김종학이다. 다시 말해 그의 생은 인간으로서의 생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예술의 본질은 차원에의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경선, 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