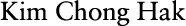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다. 물론 외롭고 고달프고 때로는 겁도 나지만, 오직 자기 홀로 서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아니 길이 없는 길을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재미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1990년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종학은 이렇게 말했다. ‘미술은 큰 길이다.’라는 신념 아래, 그의 50여 년 화업은 길을 만들고 길을 넓히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길이 없는 산을 오르고 길이 없는 숲을 헤매다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김종학은 참된 길을 걷고자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혁신적이지 않고 오히려 진부할 만큼 전통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엄정한 추상의 세계에서 순결함을 주장할 때, 구상회화로 회귀했다. 추상미술의 암묵적 순결함에 동행하지 않음을 꾸짖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었다. 한편 동시대 구상미술이었던 민중미술이 시대적 대의명분이나 정치적 구호를 앞세울 때 김종학은 꽃과 나무, 산과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대를 앞서 나가기보다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였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마음 닿는 대로 살아가고, 자연을 빌어 삶을 예찬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움의 충격이라는 말초적 자극에 중독되어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미술에 대한 대안이기도 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김종학의 그림이야말로 “회화가 위축되어 가는 시대에 다시 만난 가장 회화다운 회화”라며 그 위상을 평가했다.
이번 전시는 그의 1950년대 후반 그림부터 시작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초기 그림들은 전후의 한국 상황을 반영한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상실감과 상혼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낙관론euphoria과 결합되어 서양의 현대미술을 모방하는 단계였다. 여인의 누드를 입체주의적으로 분석한 <추상-여인(1959)>은 서울대 회화과 재학시절에 그린 것으로 학교에서 습득한 서양화 교육에 충실하고 있다. 군 복무 중이던 1960년에는 신세대 작가들과 함께 ≪60년 미술가협회 전≫에 참여했다. 이 가두전시는 덕수궁 돌담 벽에 수백, 수천 호의 그림들을 걸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이듬해부터는 안국동에 있는 ‘이봉상 미술연구소’를 오가며 박서보, 윤명로, 김창열 등과 교감하면서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뜨거운 추상, 즉 앵포르멜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젊은 날의 풋풋한 열정과 창작에의 열의가 샘솟던 시절이었다. 김종학은 동인들과 뜻을 합해 ≪60년 미술가협회 전≫을 전신으로 하는 미술단체 ‘악뛰엘’을 1962년에 결성하여 그 창립전에 출품한다. 당시의 작품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즈음에 제작된 그림들을 통해 추상표현주의 영향을 받은 격렬하고 과감한 붓질과 거칠고 두터운 마티에르가 인상적인 작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603(1963)>이나 캔버스에 마대를 붙여 어두운 색조로 마감한 <추상(1970)>등은 박서보의 초기 <원형질> 연작과의 정서적, 형식적 유대감을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 한국 화단에서는 새로운 기법의 하나로 판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김종학 역시 한동안 판화 작업에 열중하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 판화전(1958)≫, ≪서독 현대판화 전(1958, 1960)≫, ≪현대 미국판화 전(1959, 1966, 1968)≫, ≪브라질 현대판화 전(1963)≫, ≪일본 현대판화 전(1970)≫ 등 1950년대 말부터 활발히 개최된 국제 판화전들이 외국 원화를 직접적으로 접하기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세계 미술의 최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된다. 김종학은 1963년 국립기관이 주최한 최초의 판화전인 ≪판화 5인전≫의 출품을 기점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회화보다는 판화 작업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1968년에 결성된 ‘한국 현대판화가 협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1966년 ≪제5회 동경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그의 목판화 <역사>가 소개된다.
1970년대 초반까지 김종학은 일본에 잠시 머물며 판화를 실험하기도 하고, 전위적인 설치미술을 시도하는 등 변화와 모색을 거듭해간다. 1975년부터는 출세가도를 상징하는 국전 추천작가로 선정되는 등 전업 화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가 싶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1977년 뉴욕 프렛 그래픽 센터로 연수를 떠났다. 안주하지 않고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서양의 추상미술을 동경해왔던 그였지만, 정작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들은 구상 회화였다. 한지에 검은 수묵으로 그린 뉴욕의 마천루 풍경, 어두운 회갈색 조의 정물화와 인물화가 주를 이루었다. 가족과 함께 체류했던 일본 시기와 달리, 혈혈단신으로 미국에서 생활했던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음울한 정서가 배어 있다. 그리고 그즈음 들려온 고국에서의 갑작스러운 기별에 황망한 마음으로 귀국을 독촉하게 된다. 1979년 가을의 일이었다. 곧이어 오늘날의 김종학을 있게 한 ‘설악산 시대’가 시작되었다.
설악산에 간다는 것은 설악산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신비에 진입하는 것이고, 그 장엄한 신비에 침입하고 나면 영혼의 빛깔이 달라진다.
소설가 이병주는 그의 『설악산송雪嶽山頌』에서 설악산을 ‘예술로서의 산, 산으로서의 예술’이라고 예찬했다. 오늘날 ‘설악의 화가’라 불리는 김종학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극심한 좌절을 경험한 곳도,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되찾은 곳도 설악이었다. 고갱에게 타히티, 엔젤 아담스에게 요세미티가 있었다면 김종학에게는 설악이 있었다.
1979년 가을, 김종학은 세상사를 등지고 도피하듯 무명의 자연인으로 설악산 자락을 찾아 들어갔다. 성난 맹수처럼 설악산 자락을 배회하며 울분을 달랬고, 바람이 매섭던 그 겨울을 견디어 냈다. 그리고 어느덧 봄이 한 뼘씩 오르고 있는 설악산에서 그는 죽음을 딛고 솟아오르는 꽃과 풀을 보며 희망을 찾고 다시 붓을 들게 되었다. 남루한 삶의 시련에 상처받은 그의 영혼은 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치유되고 예술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지기知己 송영방이 지적했듯이, 김종학이 설악산으로 들어간 것은 자연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새로운 “화두를 찾아 나선 길”이었다.
김종학의 그림에는 설악의 산과 들, 계곡, 곳곳을 누비고 다닌 그의 발자취가 담겨있다. 몸으로 체득한 자연의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색과 질감, 감정이 느껴진다. 그의 풍경화 속에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다. 그곳은 인간이 다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야생의 숲이고, 다른 사람이 밟아보지 못한 땅이다. 서양의 전통에서 풍경화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숭고미(the sublime) 경향과 이상적 전원풍으로 관조적 위안을 주는 픽쳐레스트(the picturesque) 양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김종학의 풍경화 속 자연은 인간을 압도하여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로 위축시키지도, 낭만에 젖어 달콤한 언어를 속삭이지도 않는다. 거칠고 투박하면서 화려하고, 산만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연으로 꽉 채워진 내밀한 풍경 속에 가리어진 길을 내고 헤쳐 가는 그의 작품에서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과 작가의 힘찬 기운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작가가 추구하는 기운생동 氣韻生動의 세계이며, 남성적 호쾌함이 넘치는 신명 神明의 세계이다.
나약하고 여성적인 꽃이지만 김종학이 붓을 휘두르면 울긋불긋한 꽃으로 뒤덮인 만화방석滿花方席도 선이 굵은 남성적 풍경으로 변모한다. 꽃, 풀, 새, 나비 등 소재는 개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캔버스 안에서 총체적으로 융화되면서 거대한 자연의 노래를, 그 농밀濃密한 기운을 뿜어낸다. <No. 7(파라다이스)>, <No. 5(물총새와 냇가)>등 이번에 전시되는 대형 그림들은 관람자를 화면 안으로 초대하여 주위를 에워싼다. 그리하여 관객은 설악의 공간 속으로 뛰어들어 한여름의 녹음방초綠陰芳草 속 주인공이 된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작가의 모든 움직임과 행위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오직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감축된 현대 추상회화의 경험과는 다른 것이다. 김종학의 자연 풍경은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을 연상시키는 공감각적인 회화라는 점 또한 흥미롭다. 원색의 물감을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 올린 듯한 꽃잎은 만지고 싶은 촉각적 유혹으로 다가오고, 꽃향기가 온 숲을 덮어 후각을 자극한다. 한편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그림은 쾌청한 물소리를 연상시킨다.
김종학의 풍경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 四季의 순환을 통해 태어나 자라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리를 보여준다. 볕 좋은 봄날, 만화방석처럼 굽이굽이 펼쳐지는 꽃들의 향연과 여름 냇가를 휘도는 푸르른 신록의 청량함. 생명이 기울어가는 메마른 가을의 빛바랜 풍경. 청정한 눈밭 속 소나무의 꼿꼿한 기개가 서슬 퍼런 겨울. 죽음의 휴지기 休止期를 거쳐 부활하는 자연에는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과 이를 파괴하는 힘이 공존한다. 그의 그림들은 깡마른 겨울 수풀 아래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 삶의 축복에 대한 은유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자연은 겨울에 더욱 생동감 있다. 봄과 여름에는 풍성한 잎사귀에 가려져 있던 나뭇가지가 겨울이면 골격을 드러내고 하늘을 향해 위로 솟아오르는 생명에의 의지를 드러낸다. 김종학의 작품 역시 설악산의 강건한 뼈대가 융기하는 설경 雪景에서 산자락 굽이굽이 깃들어 있는 신령함이 그 자태를 드러낸다. 그의 꽃 그림에서는 각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클로즈업되며 대상과의 거리가 무한 근접으로 좁혀진다. 화면은 빽빽하게 가득 채워지지만 정작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산의 모습은 배후에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오밀조밀한 대상이 사라진 설경에서는 일정 거리가 유지되면서 산의 전체적인 윤곽이 한눈에 파악된다. 김종학의 설경 작품에서는 전체로서의 구성이 중요해지고 개별과 전체의 오고감이 관찰된다. 대중적 인기를 모으는 것은 그의 여름철 꽃 그림이지만, 겨울 설경의 추상적 조형미는 그 이상이다.
김종학은 자신의 작업을 “추상부터 시작해서 구상으로 왔지만, 추상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구상” 회화라고 정의한다. 그의 ‘추상적 구상’ 개념은 김종학이 좋아한다는 영구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주장한 ‘재창조화된(re-invented) 리얼리즘’과도 상통한다. 베이컨에 의하면 화가는 현실을 의식적으로 부정확하게 변형시켜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실제보다 더욱 진실된 리얼리티를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구적 예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를 들었다.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적 구상 회화를 지양하고, 사물에 내재된 강렬한 리얼리티를 눈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 추상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세부를 과감히 생략하고 본질을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김종학의 풍경화는 자연의 실경을 보고 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단층들(strata of memory)이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의식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는 “휘슬러(James Whistler)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종학에게 설악은 어떤 의미일까. 김종학의 풍경화는 설악산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하, 넓게는 보편적인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단지 설악산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대지를 그린다. 김종학의 그림은 자연의 풍광을 바라보고 즐기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삶을 사는 자의 발언이다. 그가 두 발 굳게 디디며 걷고 살고 있는 ‘땅의 정신(genius loci)’과 자연에 대한 송가(anode to nature)인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이다. 김종학은 설악에서 산을 넘고 인생의 고비를 넘고 ‘큰길’을 찾는 구도의 여정을 걸어왔다. 달은 차고 기울고, 삶의 길은 이어진다. 사람들은 떠나도 길은 그대로 남아 해마다 돌아오는 봄과 다시 피어나는 꽃을 지켜볼 것이다.
이순령,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