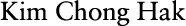봄에는 봄을 그리다
김종학金宗學이 인사동仁寺洞과
설악雪岳과 어우려낸 우리색色의 현란約爛
시작하며
예부터 ‘화여기인畵如其人’이라 했다. ‘그림은 그림을 그린 사람과 같다,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다. ‘시여기인詩如其人’이나 ‘서여기인書如其人‘에서 연유한 대목이다. 비단 이들 영역뿐만이 아니다. 음악도, 춤도, 연극도 예술작품에는 작가나 연희자의 기질과 심성心性, 그리고 삶의 여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화여기인畵如其人 김종학 화백이 반세기 동안 이루어 놓은 회화 작품들을 살피며 떠오른 첫 문구였다. 1960년대 초기부터 현재의 그림까지 ‘김종학’이라는 인간이 고스란하기에 그랬다.
김종학은 현재 화단에서 설악의 풍경과 꽃 그림으로 유명해진 70대 중반의 작가이다. 이 시대의 대표 화가로 꼽을 정도로 예술 세계를 단단히 일구고 미술사적 위치를 확고히 다진 원로이다. 지난 50여 년간 그려낸 드로잉, 판화, 수채화, 수묵화, 유화 등의 작품들을 보니, 그 세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국의 피카소라 일컬어지기에 손색없이 작업량이 엄청나다. 적어도 현재까진 한국미술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로 기억될 것이다.
청년기엔 서양 미술과 시대사조를 따르기도 했고, 다채로운 회화 세계를 탐닉했다. 전통미에 눈 뜨면서는 설악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연과 교접交接했다. 그런 가운데 김종학은 설악의 자연과 인사동의 전통미를 자신의 격정적 성정性情으로 버무려 민족 고유색의 현란함을 펼쳐놓았다. 김종학의 회화 작품은 그처럼 우리의 자연과 전통미가 만든 셈이다. 이들을 대하노라면, 새삼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재인식케 한다.
이번 기회에 김종학의 초기작부터 드로잉과 소장품을 뒤지면서 그의 튼실한 조형적 기반을 만났다. 그리고 화가의 이면異面도 화가일 수밖에 없는 예술혼을 수긍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변화가 일관되게 천진무구天眞無垢한 ‘김종학’을 드러낸다는 점은 신비롭게까지 다가왔다. 특히 때묻지 않고 깨끗한 ‘무구無垢’는 좌우명처럼 즐겨 쓰던 글귀이다.
- 내가 만난 김종학
내가 김종학 선생님을 처음 뵌 게 미대 3학년 때였다. 벌써 40년이 훌쩍 흘렀다. 판화 수업을 맡아 출강하셨다. 두 학기 동안의 판화실에서 가장 또렷이 남아있는 인상은 선생님의 ‘과묵함’이었다. 1년 내내 판화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외엔, 정말 별말씀이 없으셨다. 그야말로 침묵 교실이었다. 실기 작업 중 종종 느꼈던 선생님의 묵묵한 창밖 시선이 마치 선승禪僧다웠다. 지금도 여전하심은 아래 친구의 글에 잘 드러나있다.
요즈음 친구는 점점 말이 없다. 시비와 가부를 초월한 듯하다. 꽃을 그리지만 꽃을 그리지 않고 있다. 나비를 그리지만 나비를 그리지 않고 있다. 그는 색채의 뒤엉킴이 빚어내는 색채와 형태들 때문에 꽃과 나비를 그리고 있을 뿐이다. 그가 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뒤범벅이 된 색채와 형태 속에서 전율한다. 그는 이러한 화면과의 일체를 그림이라고 말한다.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일 뿐이야.”
그 시절 보여주신 선생님의 판화 작품은 〈전구〉(1970, 1973)와 같은 목판화였다. 1980년대 초까지 전구 외에 촛불, 감, 오이 등 단일 소재를 한 화면에 배치하는 단순함이 돋보였다. 음각 새김한 목판 위에 종이를 눌러 찍어 릴리프된 선을 따라 살짝 담채를 보강하거나 채색하는 방식을 구사하였다. 미니멀리즘에 해당되는 싱거운 화면이었다. 흰 종이 위의 흐릿하고 심심한 형상 표현과 심플한 배치는 그야말로 ‘김종학’의 침묵과 영락없이 닮았다고 생각했었다. 당시 그룹 활동을 함께하던 유사 경향의 작가들과도 크게 다른 성격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뚜렷하다. 미니멀 아티스트 가운데 –입으로 작업하지 않고 말로 작품을 설명하지 않는– 가장 미니멀한 침묵을 보여 주셨다고나 할까. 왜 하필 전구를 등장시켰는지 최근 만남에서 다시 여쭈었을 때도 답변은 지극히 짧았다. “판화 공부하러 동경에 갔을 때(1968-70) 그런 공업 기구를 그리는 작가들이 눈에 띄기에 작품화했네.” “그 시절 입체 미술이나 행위 예술도 시도해보았고.” 였다.
1960년대 김종학이 한때 추상표현주의에 심취했다는 사실은 미술사를 공부한 후에 알게 되었다. 김창열, 박서보, 윤명로 등과 함께 1962년 ‘악뛰엘Actuel’의 창립동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청년 작가들은 거의가 구미歐美의 1950-60년대 전후前後 앵포르멜Informel계열의 영향을 받았다. 〈작품603〉(1963), 〈추상〉(1964)등 1960년대 초반 김종학의 추상 작업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시켜 놓고서 넓고 빠른 붓질을 직선으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얼핏 보면 술라쥬Pierre Soulages(1919-)나 스타엘Nicolas de Stael(1914-1955) 같은 작가의 화풍을 연상시킨다. 대학 시절 만났던 ‘김종학의 침묵이나 심플’과는 사뭇 달라서, 고개를 갸웃했었다. 그 별격의 ‘김종학’을 수긍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흘렀다.
‘또 다른’ 별격의 격정성을 확인한 것은 『선미술選美術』 1987년 봄호에서였다. 선화랑에서 발행한 계간 잡지였다. 서울미술관과 동시에 선화랑에서 가진 대규모 개인전을 계기로, 『선미술』이1987년 봄호에 특집으로 「작가연구: 김종학」을 다룬 것이다. 개인전과 잡지에 소개된 1985-86년도의 작품들은 ‘김종학’ 화풍의 전신이 된다. 화려한 채색의 꽃 그림들 〈산과 나무와 꽃〉,〈꽃과 나비〉 등과 인물화 〈남과 여〉와 〈얼굴〉들이 어울려 있었다. 얼추 칸딘스키 풍의 수채화나 과슈, 그리고 유화나 아크릴물감으로 그린 작품들은 김종학의 새로운 변모를 각인시켜 주었다. “김종학은 마치 색채의 폭풍과도 같고 회오리바람과도 같은 감각적인 색채의 난무 속에 스스로를 불사르고 있다. 이 같은 미적 흥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처럼 김종학은 초기의 추상표현주의적 격정을 ‘색채의 폭풍 같은’ 꽃과 인물 그림으로 전화轉化시켰다. 1970년대 침묵에 잠시 감추어졌던 ‘미적 흥분’을 구상화具象畵로 되살려낸 셈이다. 또 그 격정은 ‘김종학’의 타고난 기질에서 출발한다. 이는 언젠가 봄물살을 보고 자신을 빗대 쓴 아래의 메모에 확연히 드러난다. 예술적 멘토 격이었던 반 고흐Van Gogh와 팔대산인八大山人과 김홍도金弘道를 퍼뜩 떠올렸던 점도 김종학답다.
설악산 눈 내리는 물이 무섭구나. 여름에 애들이 수영도 하고 고기 잡는 둑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힘차고 물살이 빠른지 몰랐다. 마치 평안북도 사람처럼 급하구나. 아니 나처럼 급하고 미쳐 있구나. 바람 센 둑에 털썩 주저앉아 내가 마치 반 고흐처럼, 아니 팔대산인처럼, 아니 김홍도처럼 비록 연필이지만 손으로 꼭 붙잡고 급하게 그렸다.
- 스케치에 붙인 소감에서,2001년 2월 23일 아침 아홉시.
나는 대학 졸업 후 그 『선미술』의 1987년에 김종학 선생님의 근황을 만났다. ‘설악의 화가’가 되기까지 회화 예술과 삶의 궤적은 본인과 여러 사람의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세계적인 작가를 꿈꾸며 뉴욕에 진출해 보았고, 동어반복적인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에 대한 회의가 몰려왔다고 한다. 첫 부인과 이혼하며 집안의 어려움도 뒤따랐다. 1970년대 후반은 그렇게 예술적 갈등과 인간적 상처가 겹쳐 있던 시기였다.
40대의 방황기에 흥미로운 작업은 수묵화이다. 뉴욕 시기(1977-79) 이후에는 도시 빌딩과 마을, 그리고 도로 풍경을 먹색으로 그려보기도 했다. 입체파식 〈회색산〉(1978)과 같은 유화 작업을 병행하였다. 세잔느풍 패치patch형태의 붓 터치를 반복한 새 시도였다. 지금도 ‘10년쯤 더 있었더라면…’ 여운을 남기지만, 짧은 뉴욕 시절 추상이나 미니멀 계열이 소수임을 알게 되었다. 수묵 그림의 맛과 구상 작업에 대한 자신감을 안고 귀국한 게 성과였다.
미국에서 귀국 후 가정사를 정리하며 1979년 여름 설악산 입구 속초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1983-85년에는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1987년에 설악산으로 작업실과 생활공간을 통합하였다. 막 50대에 들어선 때이다. 개성적 화풍에 대한 자신감으로 작품에 몰두하며 자신의 회화 예술을 정착시키는 시기를 맞는다.
김종학의 회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1960-78년에는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실험기이자, 그에 대해 회의를 갖는 시기이다. 1979-86년 사이는 변화의 모색기이다. 설악을 만나고 자연과 전통미에 회귀한 김종학 화풍의 형성기이다. 설악에 정착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는 김종학 회화 예술의 성숙기라 할 수 있겠다. 2006년부터는 상상화의 새 전개를 보이는 듯하다. 이렇게 김종학은 설악의 품, 곧 산과 강과 바다를 아우른 대지大地의 자연에 안겨 자신의 작품세계를 완성했다. 동시에 서울에 들르면 김종학의 발길은 인사동과 장한평을 어김없이 내왕하였다. 그곳에서 만난 전통미 또한 김종학 회화를 튼실히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 인사동에서 전통미에 취하다
김종학의 회화 예술은 미술계의 평가대로 한국의 전통 미술에 기반을 둔다. 고미술품 수집은 경제력과 자신의 기호대로 목물류와 자수나 보자기 같은 생활민속품류에 집중되었다. 아래와 같이 수집의 변을 풀어놓은 적이 있다.
설악산에서 가끔 서울에 나올 때면 나의 유일한 소일거리가 골동품상을 둘러보는 시간이다. 비싼 것 싼 것 가리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멋대로 사다가 집에 그냥 쌓아 놓는다. 목기도 있고 민속품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잡동사니도 있다. 가짜를 사기도 하지만 간간이 현대적인 것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우리 목기의 매력은 무엇보다 그 비례감에 있다 하겠다.··· 목기 수집이 내 작업에 준 영향이라면 조형적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보자기의 색감과 비례감이 보여주는 현대 감각에 감격했다. 몬드리안보다 훨씬 이전에 그렇게 기하학적이고 그렇게 창조적인 물건을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음에 감탄했던 것이다.···반면 우리 것은 자기 재주대로, 그저 멋대로, 바느질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만든 것이다.···멋대로 놓아서 오히려 현대적인 것이 되고만 것이 내 마음에 든다.··· 골동만 사려고 골동 가게에 출입하는 것은 아니다. 가게주인과도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내 취향이다. 지식인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마음 편하다.
김종학 화백의 고미술품 수집은 약관 20대 후반부터 고 홍성하洪性夏 선생에게 배웠다고 한다. 당대의 수집가로 조선시대 회화 컬렉션으로 유명했던 분이다. 안목을 키우는데 최고의 교사를 만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옛 문화유산에 심취했고, 강원대학교 교수 시절에는 한국미술사를 강의할 수준이었다.
목기류에 대하여는 벌써 30-40대에 상당한 걸작들을 골라내는 실력이었다. 1987년 국립 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소장품들이 특별전으로 꾸며질 정도였다. 지금도 별도의 ‘김종학실’이 마련되어있다. 간결하고 세련미 넘치는 사방탁자, 서안, 문갑, 연상 등 선비 문인의 사랑방 꾸밈 가구들이 특히 조선 목공예의 예술미를 한껏 자랑한다. 개다리소반과 찬탁, 의걸이장이나 약장 같은 생활 가구도 나무 무늬와 비례감이 시원한 눈 맛의 명품들이다.
현대적인 심플한 덩치의 목물이나 석물류부터 촘촘한 무늬와 화사한 색상의 자수나 보자기, 의상, 베갯잇 등 여성 생활품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모았다. 그 가운데 염직 공예품류는 민화들과 함께 김종학의 현란한 꽃 그림을 발전시키는데 영감을 주었다. 멋대로의 형태미와 화려한 색채 미가 그러하였다. 조선 후기 문인석이나 돌부처 같은 석 물류들,그리고 목동자 조각상 등은 김종학의 인물화와 무관하지 않다. 다양한 남녀노소의 얼굴 그림을 보면, 1980년대 민주화의 파고 속 변혁기 한국인이 지녔던 무표정을 떠오르게 한다. 재혼할 때는, 소장하던 조선 후기 민불형民佛形돌부처 닮은 부인을 맞이했다고 한다.
김종학 컬렉션은 이들로 그치지 않는다. 조선 시대 고서화 수집품도 그의 안목을 보여준다. 우선 추사秋史김정희金正喜(1786_1856)의 〈산해숭심山海崇深〉이나 〈죽로지실竹爐之室〉이라는 현판과 서첩을 모았다. 조선 시대 최고의 붓 맛을 지닌, 개성이 강한 추사체를 지고의 스승으로 삼는다. 미수眉叟허목許校(1595-1682), 원교圓嶠이광사季匡師 등 개성미가 뚜렷한 글씨들의 수집도 눈에 띈다.
필세가 분방하고 거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은 타고난 김종학의 기질 탓일 거라 끄덕였다.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쓴 직선으로 내지르듯 대범한 필치의 행서첩을 보고 새삼 그렇게 생각되었다. 주희朱熹의 ‘취하축융봉작醉下祝融奉作’이라는 칠언시를 한 면에 한 자씩 쓴 것이다. 이 서첩은 ‘조선 후기 그림과 글씨’라는 학고재 화랑의 기획전에 들렀다가 세찬 필치만 보고 대뜸 구입했다고 한다. 작업실에 걸린 염재念齋송태회來泰會의 행서체 〈대은정大隱事〉과 안채 문지방에 걸린 관악觀岳신준식申俊湜의 예서체 〈일치一痴〉같은 현판 글씨에는 김종학의 인간과 생활 철학이 담겨있다. ‘큰 은둔처의 정자大隱事’와 ‘한 바보一痴’라는 의미가 그러하다.
많은 작품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그림 수집도 상당하다. 능호관凌壺觀이인상李麟祥(1710-1760)의 〈묵란도墨蘭圖〉는 간일한 문인화격을, 단원植園김홍도金私道(1745-?)의 〈파도와 물새〉나 북산北山김수철金秀哲(19세기)의 〈묵국도墨菊圖〉 등은 풀어진 수묵의 농담이 작은 화면과 어울려 맛깔스럽다. 3.6-조선시대 수묵화의 선미禪味를 한껏 담은, 농익은 명작들을 모았다. 추사나 우암의 서예작품처럼 빠른 붓길과 기세를 좋아하는 반면에, 수묵화 수집품은 섬세하고 아련한 그림이다. 이들을 따라 김종학은 수묵 스케치를 즐겼고 동양서화의 맛을 찾으려 애썼다. 그도 자주 피력하듯이, 설악산의 겨울 그림에 수묵화의 구성미와 필묵聲墨감각이 잘 살아있다.
조선미朝鮮美를 사랑한 김종학의 안목은 고미술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1970-80년대에 이중섭李仲燮(1916-1956)의 대표작 〈빨간 소〉,〈까마귀〉, 닭 그림 〈부부〉 등을 수집한 적이 있었다. 우리 근현대미술에서 이중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김종학의 예술적 성향과 같이한다. 예술성과 미적 형상을 채는 눈썰미는 누구도 쉽게 따르기 힘들게다. 숱하게 골동 가게를 뒤지고 다닌 발품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아름다움을 고르는 직관력이 타고나지 않았나 싶다. 그 특별한 안목은 ‘김종학’의 꾸밈없는 심성과 기질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김종학의 컬렉션은 그의 회화 경향과 흡사하게 폭이 넓고 다채롭다. 고미술을 사랑하는 취향과 놀라운 수집벽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한때는 목기류나 민예품을 살 욕심에 전력을 다해 작업에 매진할 정도였다고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 시대 목기류는 김종학의 안목을 높였다. 자수나 민예품들은 김종학 회화의 색감과 모티브를 제공해 주었다. 석불이나 목동 자상, 문인석에 새겨진 얼굴형의 김종학표 인물화도 빼놓을 수 없다. 〈자화상〉(1994)을 비롯해서 드로잉이나 수채화로 그린 남녀노소의 <얼굴>들, <군중들>, <누드> 등이 있다. 그가 자주 쓰는 말대로 전통에서 ‘커닝’해서 자기화, 현대화해내었다. 이는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고 창조한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모범적인 실천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최근 몇 년 새 김종학은 인사동과 장한평에 발길을 끊었다. 하긴 2000년 초반에 인사동이나 전시장을 오가며 자주 만나거나 식사자리를 같이 했었는데, 요즈음 통 뵙지를 못했다. 골동 가게 주인들이 모두 선생님을 그리워한다고 전하자, “글쎄 구경이라도 다녀야 하는데, 보면 사는 습관 때문에···” 하신다. 고미술상들은 모두들 김종학을 멋쟁이라며 칭송한다. 눈 밝은 안목과 빠른 판단, 그리고 고미술품에 대한 돈독한 애정, 특히 값을 잘 흥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의 남다름이라 이야기한다. 또한 한결같이 ‘어린애’ 같이 ‘순수’하고 ‘솔직’한 어른이라는 공통분모를 꼽는다. 이들은 요즘 말로 영혼이 맑은 ‘김종학’을 읽는 키워드라 할 수 있겠다. 욕심 없이 순박한, 어린아이의 눈과 마음을 지녔기에 그가 설악의 자연과 그토록 동화同和되었을 것이다. 대자연을 품은 큰 인간, ‘자연인自然人’이 김종학이라는 생각이 새삼 든다.
- 설악에서 설악의 사계를 그리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79년 여름, 나는 설악산으로 도망갔다. 가정도 떠나고 싶었고 화단으로 부터도 떠나고 싶었다.··· 한 번 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내 마음대로 그리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고독하고 싶어 설악산에 와 자연과 같이 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산과 같이 지내며,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겨울을 그리고 있다. – 1994년 4월
이처럼 1979년 여름, 속초의 설악산 입구 개울가 너른 솔밭에 작업할 터를 잡았다. 42세 때였다. 우연치 않게 친형의 도움으로 설악산과 인연이 맺어졌다. 설악산은 인근 북쪽의 금강산과 쌍벽을 이룬, 암봉岩峯과 계곡이 아름다운 영동嶺東의 명산이다. 금강산의 미모 탓에 그 뒤편으로 밀려 있지만, 실제로는 금강산보다 봉우리가 높고 계곡이 우람하다. 금강산의 아기자기함에 비해 원시성과 야성미를 간직한 곳이다. 설악산과 함께 김종학의 회화 예술이 이룩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설악과 김종학의 만남은 필연이 된 것 같다. 명승名勝이 명인名人을 끌어당긴 걸까.
설악의 보름달을 배경으로 노란 꽃과 함께한 〈가족〉(1979)의 얼굴들은 우울하다. 짙은 녹청 색조와 누런 해바라기와 새들의 〈꽃밭〉(1979-1980)은 한여름이면서도 어둡고, 적갈색조의 〈가을 석양〉(1980) 풀숲들은 스산하다. 설악산과의 첫 만남들이 그랬던 모양인즉, 이혼의 충
격 직후 김종학의 괴로움으로 읽힌다. 세월이 지나면서 설악의 〈꽃무리〉(1982)를 새롭게 만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꽃〉(1985), 〈숲〉(1986), 〈잡초〉(1987,1989), 〈태양과꽃무리〉(1987,토탈미술관) 등은 남보라색이나 연녹색 배경으로 그려졌다. 나비, 새, 풀벌레들이 꽃의 화사함과 어울린 김종학의 회화적 스타일이 정착되었다. 지금의 설악산 작업실과 주거 공간을 완성한 1987년 이후, ‘설악산 작가’로 이미지가 굳혀진다.
재혼한 뒤 생활의 안정도 찾았다. 그리고 50대 이후 인생과 자연을 읽는 여유도 생겼다. 더불어 청년기의 강렬한 기운을 다시 회복한 듯하였다.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에서 빠져나와 구상具象작가로 변신한 이후, 그리는 대상마다 그림이 되었다. 김종학 화풍이 확고히 뿌리를 내렸고, 신바람으로 다작을 쏟아냈다. ‘맘에 드는 100점은 남겨야지’ 하며 딸에게 약속했던 게 1,000여 점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 미술계가 작품의 수량을 갖고 얘기할 작가다운 작가를 보태게 된 것이다.
에너지 넘치는 화면 운영과 필력이 생래生來의 기질대로 한껏 구사되었다. 왕성한 기운은 햇볕 쏟아지는 풀숲과 숲의 여름 그림에 넘쳐났다. 짙게 드리운 암녹색 그늘을 맛 내면서 대지의 생명력을 담아냈다. 그만큼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계곡의 살결과 산악의 위세가 화면에 넘실댔다.
〈폭포〉(1987,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와 〈숲(폭포)〉(1980년대 중반, 서귀포 기당미술관소장)부터 〈호반새〉(1994), 〈설악의 여름〉(1998), 〈새와 폭포〉(1999), 〈설악산 풍경〉(2002), 〈물총새와 냇가〉(2006), 〈여름〉과 〈여름 냇가〉(200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까지 수직과 수평, 사선구도의 조합으로 쏟아지는 폭포와 개울가를 배경으로 설악의 속살을 꾸준히 드러내었다. 이런 경향은 여름이 아닌 〈설악 폭포 주변〉(1999, 포스코 미술관 소장), 〈일지매〉(2001), 〈설악산 겨울 풍경〉(2001)이나 〈냇가와 생강꽃〉(2002), 〈적송〉(2003) 같은 작품에서도 보인다. 이 외에 폭포와 암벽의 날카로운 각을 세운 〈직폭〉과 〈쌍폭〉(1993), 〈토왕폭〉(1993), 〈가을 폭포〉(2003) 등은 설악의 내면 깊이 웅숭한 맛을 물씬 내었다. 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의 진경산수眞景山水화풍을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한편 김종학 풍의 꽃 그림 가운데 〈유채밭〉(1985, 2002), 〈맨드라미와 꿩 한 쌍〉(1998), 〈벚꽃〉(1998), 〈진달래〉(1998), 〈백화 만발〉(1998), 〈매화〉(2000), 〈철쪽〉(2001), 〈복사꽃〉(2001, 2003, 2009), 〈생강나무꽃〉(2001), 〈백화만발〉(2001), 〈할미꽃〉(2001, 2002), 〈나팔꽃〉(2003), 〈호박꽃〉(2003, 2004), 〈박꽃〉(2006), 〈맨드라미〉(2007) 등은 같은 꽃 무리로 화면을 꽉 채운 작품이다. 〈개나리〉(2003),〈복사꽃과 새〉(2003), 〈개나리와 달〉(2006), 〈철쭉산〉(2006), 〈그믐달 복사꽃〉(2008) 같은 봄꽃그림 역시 단일 색을 배경으로 동어반복의 리듬을 구사하여 주목을 끈다. 마치 전면회화All Over Painting형식의 현대 추상화를 대하는 듯하다. 이런 스타일은 때론 자수나 민화풍에서 빌어온 아이디어도 있지만, 김종학이 설악에서 읽은 자연의 질서이다.
전면회화全面繪畵형식은 〈가을 석양〉(1980) 이후, 꽃이 지고 말라가는 〈가을〉(1992, 2006) 풀숲이나 흰 눈에 남은 〈겨울 싸리〉(1992), 〈겨울 산비탈〉(2000), 〈칡덩굴〉(2006), 〈설경〉(2008)등에도 구사되어 있다. 형식적 단순 반복의 모더니즘풍을 적절히 구상 회화로 전환시켜낸 것이다. 결국 김종학은 젊어서 방황한 예술적 갈등도 버릴게 없는게 된다.
나는 김종학의 가을 그림에 각별한 마음이 간다. 얽히고설켜 죽어가는 마른 풀숲과 황갈색이나 적갈색 세피아 색조의 환상 때문이다. 짙게 드리운 그늘은 어찌 보면 김종학의 내면 깊숙한 트라우마의 흔적으로 공감된다. 막상 김종학은 설경의 설악, 겨울을 담은 그림을 내심 선호하는 것 같다. “다 좋지만 그림의 격조를 아는 이들은 겨울 그림을 좋아할 거야. 내 설경은 그래 봐도 동양화거든.”이라고 피력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그렇다.
〈겨울 풍경〉(1998), 〈고송〉(2001-2), 〈눈, 소나무〉(2002) 등 흰 여백에 간결한 구성의 소나무 그림과 봄눈에 핀 진달래꽃의 〈설악산〉(2006),그리고 〈설악산 겨울 풍경〉(2001), 〈설경〉, 〈검은 갈색산〉, 〈흰 산〉(2008) 등 흰 눈 쌓인 설악산 전경이 수묵산수화의 구성미를 연상시킨다. 회화적 안온함에는 다시 김종학의 침묵이 깔린다. 겨울 그림을 통해 김종학 회화의 재평가도 확대되리라 기대해본다.
이외에도 짙푸르게 망망한 수평선에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불빛을 담은 〈동해 어화〉(1997), 바닷가 물속에 비친 물고기 〈두 마리〉(2001), 〈청둥오리 한 쌍〉(2006), 작은 물고기 〈쉬리〉(2007) 등과 같은 작품의 단순 화면 역시 눈길을 끈다. 김종학의 신선한 조형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김종학의 회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격의 유형이 있다. 나무로 만든 사각 접시나 목판, 제기 등 옛 목물류에 그린 꽃그림들이다. 호박꽃, 할미꽃, 연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 한 화면에 한 송이씩 가득한 꽃 모양새가 10호 이내의 캔버스 소품과 비슷하게 색다른 형상 미로 다가온다.
김종학의 채색화 꽃밭이나 꽃무리, 잡초 무성한 풀숲이나 숲 그림에는 나비, 여러 종류의 새, 닭, 꿩, 거미, 풀벌레들이 등장한다. 화면 가득 들끓는 이미지들은 그야말로 설악의 향연을 연출해 놓은 듯하다. 여기에 암탉과 수탉의 나들이, 암수 물새나 산새, 어미 새와 새끼 새, 꿩의 등장은 의인화되어 동화 세계로 인도하여 재미나다. 화면 구석구석에서 숨은그림찾기나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상상하게 한다.
변형 500호의 대작 〈파라다이스〉(2006)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 한 마리와 청둥오리, 꿩, 사슴, 토끼 등이 한 쌍씩 숲속에 보이고, 상체를 벗은 여인이 화면의 오른쪽 풀숲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진 장면이 연출되어 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등장한 공주와 토끼의 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김종학 회화의 또 다른 서사 구조이자, 70대 노경에 들어 이상향을 꿈꾸는 김종학의 심상心象의 변화도 엿보게 해주는 대작이다. 〈가을〉(2006)의 밤 어두운 마른 풀숲 그림이나 〈겨울 바다〉(2006)를 배경으로 삼은 풀꽃 그림들도 상상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들은 2006년경을 전후하여 회화 세계의 변화를 시사하는 듯하다.
- 격정의 몸짓으로 미적 흥분을 내지르다
지난 30년 동안 줄기차게 그렸다. 끊임없이 그려온 김종학의 설악산 풍경 그림들은 자연물의 형태를 담았기에 구상회화具象繪畵에 속한다. 그렇다고 대상을 앞에 놓고 사생하는, ‘눈으로 그리는 그림’은 아니다. 생각하는 형상들을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머리로 그리는 그림’이다. 동양화론으로 치자면 옛 문인들의 ‘마음 그림’ 사의화寫意畵쯤 되겠다. 다음은 침묵하는 가운데 가슴 속 격정을 풀어내는 회화 방식에 대한 증언들이다.
설악산에서 돌아와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밤마다 별을 쳐다보고 달을 보고 설악산의 밤은 왜 그다지도 낮게 떠서 빛나고 있었던지. 낮에는 그 넓은 벌판을 헤매며 열심히 꽃과 나비를 봤단다. 거기서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십 년 괴로워했던 그림의 방향도 전환점도 찾아냈다. – 김종학,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1989년 2월
새벽에 일어나 그림 그리고 있다. 어떤 때는 그리기가 싫을 때도 있지만 억지로도 한단다. 그러다 보면 또 신나는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 붓을 놓을 수가 없구나. – 김종학,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1992년 4월 11일
동양화에서 숭상하는 것이 기운생동이다. 내 경우, 기법은 서양화이지만 동양화를 그리는 셈이다. 사생한 것을 토대로 일일이 그리고 있으니 기운생동이 약해졌다. 그래서 꽃을 한참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머리에 집어넣었다가 그다음엔 화폭만 바라보고 쏟아낸다.
주제의 추상화 과정은 ‘벼락같이’ 진행하는 그의 작업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빨리 그려야 작품이 좋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천천히 그린 그림은 잘 안되는구나” 하고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털어놓고 있듯이, 빠른 붓질에서는 대상의 골격만 남고 세부는 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면 동양화가 송영방이 지어준 별호 ‘별악산인別岳山人’은 발음에서도 김종학의 스타일을 절묘하게 묘사한 것이 되고 말았다. ‘별악’을 소리내어 읽으면 ‘벼락’이지 않은가.
고무줄을 잡아당긴 팽팽한 긴장 상태. 그런 긴장 상태에서 그림이 나온다. 그러나 팽팽한 고무줄을 놓으면 원상태보다 뒤로 튕겨 나간다. 다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면 배倍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김종학의 메모에서, 2000년5월
김종학은 대상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실내에서의 캔버스 작업은 스케치에 의존하지 않고 머리에 기억된 형상을 체화體化 해내는 일이다. 옛 문인화론에서 ‘가슴속의 대나무를 그린다’는 소동파蘇東坡의 ‘흉죽성죽胸中成竹’에 해당된다. 또 캔버스에 기억된 형상을 펼칠 때는 빠른 직감에 의존한다.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벼락같이 즉흥卽興을 쏟는다. 몸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낮보다는 몰입하기 좋은 한밤중이나 새벽 같은 고요한 시간을 택하여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화면에 연출한 대상들은 꽃이면 꽃, 나무면 나무, 산이면 산 등 형형색색의 특징을 적절히 드러낸다. 구상화이면서도 단순화한 형태감에는 추상성이 담겨있다. 그렇다고 추상 회화의 화법처럼 주관에 따라 재구성하는 의도는 드러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감성의 흐름을 따른다. 구상과 추상성이 복합된 김종학의 형상 표현에 대하여, 한 원로 수묵 화가의 아래 증언에 공감이 간다.
스스로 생겨난 천품이 고박古朴하면서 청담淸淡한데, 운필運筆은 신속迅速,, 통쾌痛快, 임리淋漓하다. 형사形狀에 구애 받지않고 오직 생운生韻만을 구한 끝에 졸박拙朴한 가운데서 그의 흉중영기靈氣가 잘 나타나지 않았나, 나는 생각한다. ···중국 제황齊璜선생의 말처럼 “형태를 닮은 것과 닮지 않은 것 중간”의 묘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의 그림에 관한 얘기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대로 김종학의 회화론이자 예술론이다. 김종학은 실물을 사생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유형은 아니기에, 내뱉는 말들이 더 가슴에 다가오는 점도 있다. 창작 과정에 대한 화가의 생생한 녹취여서 그렇다. 김종학은 마음, 곧 머리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구상하여왔다. 서양의 표현주의 예술론이나 동양의 서화론과 근사한 편이다. 또 그의 화면은 얼핏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 전면을 꽉 채우든지, 여백 부분이 생기든지, 사선으로 배치하든지 나름대로 질서를 보인다. 비워지거나 채워지면 될 뿐 꾸밈새가 의도적이지 않다. 화폭의 공간 구성부터 즉흥적 직관에 의지한 탓이다.
그렇다고 김종학이 스케치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늘 설악의 주변 자연을 머리에 담는데 그치지 않고 부지런히 사생하며 눈에 익혀왔다. “스케치를 다시 캔버스에 옮기면 그림이 쩨쩨해져, 스케치는 스케치로 그쳐야지···”라며 꺼내놓는 연필, 수채나 수묵의 사생화들이 상당하다. ‘과연 김종학 회화의 예술적 포스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붓끝에서 분출되는 과감한 생략과 변화의 분방한 형상성을 수긍케 해주기 때문이다. 이들 스케치만 가지고도 앞으로 김종학을 재평가하게 될 것 같다.
화면 구성과 형상 미와 더불어 김종학 회화는 필치나 색감에 그 개성미가 뚜렷하다. 유화보다 빠르게 건조하는 수성 아크릴물감을 선호한다. 붓질은 속도감 나고 대담하다. 눈으로 익힌 대상을 가슴에 삭힌 대로 ‘벼락’같이 그린 형상들이 꿈틀대게 그린다. 자연히 감정의 기복을 따라 즉흥적 필세와 어울린 색채 감각 또한 급한 편이다. 물감과 물감, 물감과 기름이나 물을 섞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게다. 물감 튜브를 직접 짜 캔버스에 바르기도 한다. 원색 조의 화면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붓과 색은 그렇게 격정의 몸짓으로 미적 흥분을 내지르게 하였다. 질료감의 니글거리는 움직임을 보면 육감적이다. 김종학의 화면에는 가슴으로 그린 색상의 리듬감이 생생하다.
- 현란한 민족색으로 생태 예술이 되다
김종학은 분명 우리 시대의 빼어난 채색화가이다. 구상 계열의 채색 화가로 치자면 김환기·이대원·천경자에 이어, 김종학이 자기독창성을 가장 선명히 부각시킨 작가이다. 한국 현대 회화사의 위치에서도 이중섭·박수근·김환기의 차세대로 우뚝하다. 또한 전통 시대와 현대를 통틀어보면, 김종학의 한국 회화사적 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김종학 회화에서 이점을 새롭게 보고 싶다. 현란한 색감과 색채 배합에 김종학 회화 예술의 개성미가 넘친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갈색 등 짙고 안정된 원색조의 색채 활용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여름 그림에서 초록색을 바탕으로 삼은 빨강색의 보색 대비가 눈길을 끈다. 이런 색채의 배열과 대비는 한국 회화사에서 눈에 익은 전통 색감과 유사하다. 웅혼한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섬려한 고려 불화, 조선시대 불화와 단청 장식, 조선 후기 궁중화나 민화, 김종학 컬렉션에 포함된 자수나 섬유류의 민속 공예에 이르기까지 1600년 이상 지속해온 민족적 색채 감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화려한 색채 정서를 즐긴 한韓민족의 후예라 할 수 있다. 김종학이 감성적으로 쏟아 낸 채색화에 대한 대중적 인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어필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민족 고유의 색채 정서를 현대에 재창조하고 발현發現해 놓았다는 점만으로도, 김종학의 회화가 우리 시대에 남긴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그는 자기 회화를 “서양 현대미술을 공부한 것에 전통미를 ‘컨닝구’하면서 ‘비빔밥’을 만든 거지”라고 즐겨 말한다. 김종학의 드로잉이나 회화를 훑어보면, 인상파부터 개념예술까지 솔직하게 흡수되어 있다. 반 고흐나 세잔느, 칸딘스키나 마티스나 피카소, 술라쥬나 스타엘, 루오, 루소, 르동, 샤갈 등이 부분부분 다채롭게 보인다. 그것만이 아니다. 평안도 출신 선배인 이중섭이나 박고석, 그리고 미대 스승인 장욱진도 그에게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또 화면 구성이나 붓질 감각은 곧잘 동양회화의 형식미를 떠오르게 한다. 특히 중국의 팔대산인八大山人이나 제백석齊白石을 비롯해서 겸재 정선, 능호관 이인상,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 우암 송시열 등 조선 서화에 대한 돈독한 애정과 이들을 눈 여겨본 필묵법筆墨法이 김종학의 화면에서 읽힌다. 김종학 예술의 독창성은 이같이 폭이 넓고 속 깊게 자신이 살면서 만난 것들을 소화시켜 다져낸 것이다.
김종학의 예술을 가능케한 대상은 무엇보다 설악의 자연풍광이다. 산과 강과 바다, 그 대지에 자랐다 스러지는 숲과 꽃과 풀숲, 여기에 공생하는 나비와 새와 풀벌레, 이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김종학을 김종학답게 만들었다. ‘설악은 봄 할미꽃 피는 광경을 보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듯이, 설악은 김종학의 인생에 대한 절망감과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를 한꺼번에 해소해주었다. 설악산의 사계 순환은 분명 김종학에게 치유의 공간이 되었으니, 설악의 자연을 일군 김종학의 회화는 생태生態예술이라 할 만하다. 생운生韻이 넘치는 순수 자연인, 김종학의 붓질과 색감이 내뿜는 에너지는 자연미自然美의 근사치이다. 그것만으로도 생태적 회화 예술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김종학이 재창조한 민족 색의 현란絢爛은 요즈음의 친환경 의식과 어울린 셈이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 자연성을 잃은 채 오염된 환경의 현대 대중들에게 김종학의 회화가 주는 메시지의 하나일 법하다. 김종학 회화가 인기 있는 이유도 그런 점에 있지 않을까. 아무튼 김종학의 설악 풍경은 우리나라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이 예술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큰 진원震源인지를 알려준다.
‘색채의 폭풍과도 같은 미적 흥분’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김종학의 화면은 숨이 막힌다. ···자연 및 우주의 거대한 울림은 뜨거운 에너지로 화면에 폭발한다. 화면에 다가가면서 숨 막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생경한 자연 또는 우주의 기운에 부딪히기 때문이다.”라고 상찬하는 평론가도 있다. 이경성과 오광수에 이어 전람회 때마다 최석태, 유준상, 유재길, 윤우학, 김복기, 고동연, 김애령, 그리고 김종학의 작가론을 가장 많이 쓴 김형국 등의 평론들이 자자하다. 이들 모두 김종학이 한국 현대화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실감케 한다.
크고 작은 전람회를 통해 김종학은 그처럼 호의적 평가를 받았다. 원화랑, 선화랑, 박여숙화랑, 예화랑, 갤러리현대, 가나아트센터 등에서의 개인전은 성황을 이루면서 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2004년의 갤러리현대와 2006년의 가나아트센터 개인전은 대작을 중심으로 김종학 예술의 피크를 보여주었다. 그런 만큼 좋은 작품이 쏟아졌고, 한때 투자가치 일 순위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마치며
김종학의 그림은 김종학의 민낯이다. 세속과 떨어진 공간에서 정적이 깃든 시간에 그리는 고독한 작업은 곧 자기 응시이자 자기와의 대화이다. 고요에서 김종학이 쏟아내는 이미지들은 그대로 김종학의 맨 얼굴이자, 그 몸짓을 읽게 해주는 거울이다. 느낌대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표현력은 역시 말수 적고 꾸밈없는, 건장한 평안도 사내의 기질과 맞닿아있다. 또 자신을 감추지 않는 성격대로 김종학의 예술은 그의 영혼이 깃든 분신分身이자 인생이라는 점도 실감케 한다. 서두에서 ‘화여기인畵如其人’이라 했지만, 자기 그림에 자신을 온통 드러내는 작가가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 김종학의 경우처럼 정말 무구無垢하고 맑은 심성의 소유자라야 가능한 일이다.
김종학은 그림을 그리며 질박한 자연인自然人의 상태를 줄곧 유지해왔다. 그러했기에 우리 고미술의 아름다움에 푹 심취했고, 그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를 자기화 해내었다. 또 김종학은 설악의 자연과 한 몸이 되었고, 그만큼 설악의 대지와 속살을 드러냈다. 중국 북송대 곽희郭熙의 산수화론 ‘숲과 샘의 마음林泉之心’ 상태에 이른 셈이다. 그 정서로 봄에는 봄을, 여름에는 여름을, 가을에는 가을을, 겨울에는 겨울을 계속 그리고 싶어 한다. 그토록 그렸어도 새봄은 늘 새롭다고 한다.
설악의 마음이 되어 설악의 지력地力을 받아 그런지, 지금도 김종학의 그림에는 생기生氣가 넘친다. 단순한 노익장의 과시가 아니다. 서울과 속초를 오가며 머무는 공간은 모두 작업실이다. 자연의 교감과 그림 그리는 일과 쉼만이 오롯이 반복될 뿐이다. 설악산과 부암동의 화실을 방문하니, 미완성의 캔버스들에는 아직도 한밤중 작업에 몰두하는 김종학의 숨소리가 넘실댔다. 천정이 높은 설악화실에는 300호짜리 새와 나비와 거미와 함께한 다채로운 꽃들의 〈숲〉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부암동 화실에는 100호짜리 오리 한 쌍이 노니는 개울가 풀숲의 〈들풀〉(2011)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꽃과 들풀과 숲을 그리는 색채감이나 필치는 이전 그림과 마찬가지로 왕성하다. 2006년 이후 상상화풍의 꾸미지 않는 건 강함이 넘치는 대작들이다.
양쪽 화실은 모두 50평 남짓으로 너른 편이다. 그림 그리는 공간은 둘로 나뉘어있다. 100호 이상의 캔버스를 펼쳐놓은 절반은 아크릴물감으로 작업하는 장소이고, 그 옆에는 10-60호가량의 캔버스들을 쌓아둔 유화 작업 코너가 배치되어 있다. 설악의 작업실 곁 창고에 시렁 켜켜이 가득 쌓아둔 물감들은 화들짝 기겁할 정도이다. 김종학의 유일한 욕심 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일임을 시사하는 대관大觀이다. 설악산인雪嶽山人 김종학. 예전과 다름없이 침묵의 힘이 여전하여 반갑다. 7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온몸의 격정이 가시지 않고, ‘미적 흥분’이 식지 않은 듯하다. 어떤 작업 성과를 낼지, 얼마나 많은 작업량을 쌓을지, 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될지, 나로서는 김종학이 가늠되지 않는다. 분명한 점은 그가 우리 시대를 대표할 거장巨匠으로서 인간적 예술적 풍격風格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의 문명인들에게 그의 회화 예술이 ‘김종학’의 속내처럼 자연과 인간의 생래적生來的진면목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하듯이 김종학의 작품 세계는 미래의 현대인들까지 허브로 그 가치가 계속 빛날 거라 확신을 해본다.
이태호字泰法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