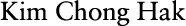김종학과 나는 이십 대에 학교에서 만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오십 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지우 (知友)다. 그의 고향은 한반도 북쪽이라 처음 보았을 때 기마 족의 후예답게 남자다운 풍모를 지닌 잘생긴 인상이었다. 학교 다닐 때는 전공이 달라 접촉이 뜸했다. 그가 미국에 몇 년 머물다 돌아오고부터는 더욱 가까워졌다고나 할까. 그의 고동벽(古銅癖) 때문에 인사동에서 자주 만나 그렇게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흔히 말수가 적은 과묵한 사람으로 알지만, 어떤 때는 불쑥 나타나서 한마디씩 던진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별명을 짓기를 ‘김 도깨비’ 라 했다던가. 하지만 그와 이야기해 보면 소년같이 천진하고 솔직 담백, 가슴이 따뜻한 친구임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그와 산행을 하거나 어디를 동행할 때 그는 묵묵부답인 채로 앞만 보고 그냥 전진한다. ‘갈지(之)’ 자 발자국을 남기는 나로서 쫓아갈 수 없는 속도다. 뒤에서 불러봐도 소용없다. 그의 삶도 그렇게 부지런히, 무소처럼 혼자 달리듯 정진한다.
지금 살고 있는 설악산 화실을 방문했을 때 주변을 산책하자 해서 나섰는데, 이리저리 길 없는 풀숲을 단장으로 헤치면서 “이것은 용담, 저건 산부추야” 말할 때는 영락없이 심마니다. “이런 것들이 내 그림 소재야” 하면서 웃는다. “이거 얼마나 빛깔이 고와. 고운 걸 보고 곱게 느껴 옛 어머니들 그리고 누이들이 버선코 수도 놓고 베갯모, 보자기에도 수놓고 했잖아” 하고 또 웃는다. 그렇게 구김살 없이 웃는 표정이 바로 김종학이다.
육이오사변이 지나고 환도 후 어렵던 시절, 화랑도 변변한 것이 없어 덕수궁 돌담에서 ‘벽전(壁展)’ 이라는 젊고 싱싱한 미술 운동을 폈을 때 윤명로, 김봉태 등과 더불어 그 일원이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이들은 지금 우리 화단에 중추 멤버들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와 설악산으로 들어간 것을 자연으로의 희귀라고 하기엔 맞지 않고, 어떤 정신적 영감과 현대성이라고 하는 문제의 화두를 찾아 나선 길이었지 싶다. 그 나름의 회화로 차츰 변신하기를 거듭하여 마침내 신명 나는 그림으로 오늘에 다다른 것이다.
언젠가 그와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는 “산속에 틀어박혀 있으니 계절 따라 꽃이 피고 지고, 온갖 새들이 날아들고, 이름 모를 풀벌레까지도 자세히 보면 참 예뻐” 하고 신선처럼 웃는다. 나는 부럽기도 했고 짐짓 추사(秋史) 선생의 글귀가 생각났다. “비유컨대 책을 짓느니, 차라리 꽃을 심어 일 년 내내 보는 것이 좋을진저. (比似著書空用力 猶得種花一年看)” 다시 말하면 ‘일 년에 걸쳐 꽃을 보면 그 속에 자연의 이치와 오묘한 진리가 있거늘, 무엇하려고 책 쓰는 헛수고를 들일 것인가’란 뜻이다. 이건 부처님 염화미소(拈華微笑)의 경지를 닮았다. 참 마음 진리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묻자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기에 수제자 가섭존자(迦葉尊者)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받았다 한다. 제자가 “무엇이 최고의 경지라 치십니까” 물으니, 소동파도 “천진난만을 내 스승으로 삼는다”고 말하였다던가. 종학이는 언제나 천진 솔직함과 불꽃같은 그 정열을 잃지 않고 만년까지 창작 활동을 이어 가리라 나는 믿는다.
한편 친구의 사람됨에 더해 작품세계를 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글로 남기는 것이 자칫 그의 내면세계를 다치게 할까 봐 망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함께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의 작품을 보고 느낀 바를 말한다면, 그는 무엇보다 이지적 화가 하기보다는 감성적 작가라는 사실이다. 그는 섬광처럼 스쳐 가는 화재(畫材)를 뇌리에 이력 하여 에스키스 해 둔다. 그리고 불현듯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의 분방한 정서가 화면에 나타난다. 그의 잠재적 조형의식과 그가 좋아하는 한국적 원시성이라 할 수 있는 민예적 감흥이 녹아내려 천진난만하고 동심적인 환상으로 나아가는 사이, 그만의 독특한 천진고박(天眞古朴)한 세계가 무르익는다.
그는 유화나 아크릴 물감을 갖고 수묵화를 치듯이 일필휘쇄(一筆揮灑)하듯 작품을 한다. 물감만 서양재료이지 동양화 작업과정과 같다. 그는 늘 팔대산인(八大山人)을 좋아하고 또 조선 시대의 이인상(李麟祥) 같은 문인 화가를 좋아한다. 그의 작업방식은 붓을 쓰다가 격정에 못 이겨 물감의 마개를 열고 손으로 짜는 동시에 화면에 격렬하게 짓이긴다. 마치 교향악의 클라이맥스에서 연주자들의 요동치는 물결처럼, 그는 그렇게 온몸으로 그린다. 그의 작업복은 물감투성이가 되고, 화실 바닥과 벽은 온통 총천연색으로 물들어 간다. 그렇지만 그의 현란한 그림은 품격을 잃지 않은 채 그가 살고 있는 설악산 주위에서 느껴지는 색과 소재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의 소나무, 바위, 들꽃, 넝쿨 숲, 새, 나비, 곤충…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
언젠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누구나 그냥 지나치는 그 흔한 호박꽃, 난 그것을 그리고 싶어.” 몇 년 동안 성공을 못 하다가 드디어 호박꽃의 진수를 터득했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그의 작품을 보니 과연 또 다른 자연의 호박꽃, 김종학의 호박꽃이 탄생하고 있었다.
골동상을 쏘다니면서 민화, 민예품 또는 자수를 감상, 수집하는 그의 일상을, 일종의 작품 제작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욕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품성과 회화조형을 합일시키고 박대정심(博大精深)하여 나름의 자기 창조의 개성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몇 년 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십수 년 정성 들여 모은 목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일괄 기증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보통사람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 감히 생각도 못 할 일을 우리 사회를 위해 쾌척했던 것이다.
동양화 전공자로서 그의 작품세계를 말한다면 그는 저절로, 그리고 스스로 생겨난 천품이 고박(古朴)하면서 청담(淸淡)한데, 운필(運筆)은 신속(迅速). 통쾌(痛快), 임리(淋漓)하다. 형사(形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생운(生韻)만을 구한 끝에 졸박(拙朴) 가운데서 그의 흉중 영기(靈氣)가 잘 나타나지 않았나, 나는 생각한다.
그의 작품은 언뜻 번잡스러워 보이나 다시 보면 번중(繁中)에도 간필(簡筆)이요, 기이하나 정(正)을 잃지 않고, 또 괴이하나 아(雅)를 잃지 않아서 중국 제황(齊璜)선생의 말처럼 “형태를 닮은 것과 닮지 않은 것 중간(形似而不似之間)”의 묘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정열을 잃지 않고 “옛것의 진흙탕에 동화되지 않는(泥古不化)”, 더욱 자기만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현대작가로 대성하기 바랄 뿐이다.
송영방 동양화가